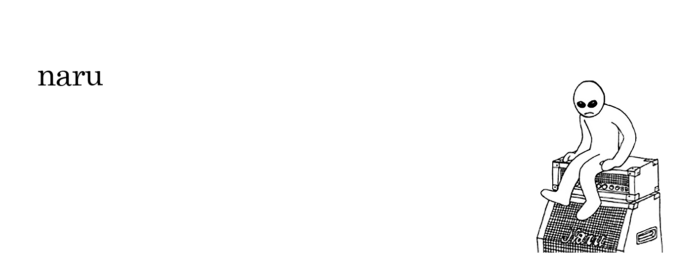기분이 좋으면 살 맛이 날 것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살 맛이 안 날 것이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많아야 더 살아볼 기운이 날텐데, 불행과 불안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안 좋은 걸 더 세밀화 하고 곱씹고, 경계한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미 굳어진 경향이라 냅두면 그 안좋은 경향을 절로 따라간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생각의 단절이 억지로 필요하다. 매일이 좋은 일의 연속이라 불안감 따위 덮어버리고 잊고 산다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기쁨과 행복의 감정에 이내 익숙해지고 무뎌진다. 행복의 순간은 점점 짧아진다. 행복감의 지속시간이 길지 못하다면 그 이후 밀려오는 공허함, 불안에 대해 그만 생각하든지, 대신 가치판단이 별로 필요 없는 일에 몰두하든지 하는 게 낫다.
몰두하는 일이 어떻게든 내게 평안을 주고 긍정적인 일이면 다행이다. 그 일 자체가 다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비관하게 하면 또 살 맛이 안난다. 그러면 또 혹시 살맛이 날까 싶은 다른 일을 기웃거리겠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그래도 내일의 뭔가를 기대하며 산다는 건 대충 저런 프로세스의 연속일거다. 나는 저런 식의 도식화와 구분에 집착하는 편이다. 좋은 거, 나쁜 거, 기운 나는 거, 기운 빠지는 거… 그건 내가 하는 일과 내게 일어나는 일과 사람…에도 적용되기 마련이다. 어쨌든 스트레스에 민감해서일거다. 그래서 나는 또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다. 구분하고, 정리하고, 대비하고 할 건 하고, 포기도 하고…머리 속은 공장같이 계속 돌아간다.
기분이 마냥 좋고 싶지만 부단히 애쓰고 피곤하지 않고야 그럴수가 없다. 다만 애쓰고 뒤따라 오는 기분 좋음이 그래도 기분상 인생의 반은 차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 이하면 이하일수록 삶이 약간 오기, 투쟁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기력이 딸려서 그건 좀 위험하다. ‘물컵이 반이나 찼네!’ 까지가 적정 허용선이다. 나는.
예전엔 줄곧 나의 감정상태가 ‘0점’ 에서 오락가락한다고 느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고, 업 될 때도 있는 거다. 항시 우울하지도, 항시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 그래도 새로운 좋은 일들도 많았던 거 같다.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개인적 경험들. 지금도 별반 다름은 없지만, 무뎌지는게 많아지고 체력도 딸리고 하면 앞으론 점점 마이너스로 치우치게 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된다. 성격 상 매일이 행복한 노년의 모습은 딱히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행으로 치닫고 싶은 것도 딱히 아니다. 그저 되는대로 부단히 뭔가 하겠지. 뭔가를 하며 잊을 건 잊고, 또 거기서 나름 뭔가를 얻으며 여력이 되는 한 까진 0점을 잡아보는 것. 그런 모습이 차라리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