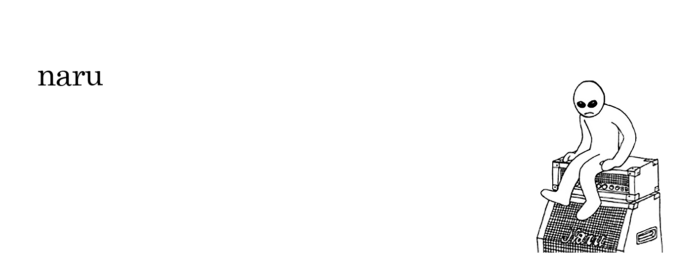겨울 저녁
나이가 드니 왠지 겨울이 좋다.
어릴 적의 나는 겨울을 싫어했다. 제일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추위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겨울이 되면 교실에서는 구식 석탄 난로를 뗐다. 나는 석탄 난로 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냄새도 나고 효율도 좋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연료로 필요한 석탄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나르게 했다.
그렇게라도 피웠던 석탄 난로를 켜 놓고 있으면 당장은 따뜻한 듯했지만 탁해진 교실 공기에 목이 아프고 피곤해졌다. 효율이 그닥 좋지 않아 가까운 자리를 제외하면 여전히 교실은 추웠다.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손은 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은 축축해진 양말, 시려운 발이 문제였다. 양말을 신고 있으니 겨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발엔 땀이 조금이라도 배는데, 그것이 찬 공기와 만나면 학교에 있는 내내 발이 시려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겨울에 대한 가장 싫은 기억이 바로 그 축축하고 차가운 양말, 시려운 발이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고, 여전히 나는 차가운 발의 느낌을 싫어하지만 그런 순간은 나의 대처 요령들과 비교적 훌륭한 실내 난방 시설들 덕분에 이제는 거의 없다. 겨울이 되어도 차가운 발의 느낌의 빈도가 줄어들고 나니, 신기하게도 이제서야 겨울의 긍정적인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나에게 있어 시린 발 다음으로 가장 큰 겨울의 이미지는 바로 짧아지는 낮과 긴 저녁이다. 당연하다. 겨울은 해가 짧다. 오후 네 시쯤만 되어도 하늘은 어둑해질 준비를 하고, 다섯 시부터는 제법 저녁, 밤의 느낌이 난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비교적 이르게 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나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어떤 안심을 느낀다.
이유가 뭘까. 오늘도 차를 타고 집에 오며, 운전 중에 보이는 하늘이 다섯 시임에도 보통의 여덟 시 같은 느낌이 들어 생각을 해 보았다.
이내 내린 결론은 안식의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저녁은 보통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이다. 집에서 쉬며, 낮 동안 부산한 마음에 해야만 할 일들로 미뤄 두었던, 내가 진짜 하고팠던 일들, 진정 원하던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늘의 밝고 어두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그 밝고 어둠에 큰 영향을 기분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짧아진 낮, 어두운 하늘은 나에게 강렬히 무얼 말한다. 나에게 어서 오늘의 안식을 갖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서둘러 집에 와, 딱히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조용히, 혹은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보게 된다. 여기서 나는 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 나는 결국 밤을 사랑하고, 부산함보다는 고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올해의 겨울이 되어서야 나는 이러한 생각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 스스로를 정립하고 정의하는 것. 그걸 계속 새삼스런 마음으로 해내는 것. 오늘의 이 작은 깨달음마저도 오늘의 짧아진 낮과 어둑해진 하늘이 가져다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별거 아니지만, 작은 신기함과 안심, 고마움을 느낀다.